<접시에 뉴욕을 담다>에는 김은희 셰프가 요리사로 살기 위해 3년간 뉴욕에 머물면서 일하고 즐겼던 다양한 명소들이 등장한다. 맛에 대한 느낌, 그 곳의 인테리어와 서비스, 사람들과의 만남 등 뉴욕의 명물 레스토랑들에 대한 그녀만의 생각을 담아 내었다.
2004년 3월 9일, 숫자 외우는데 무지 약한 내가 아직도 잊지 않은 걸 보니 그때 정말 무지 긴장하고 기대했었나 보다. 그날은 파크 애비뉴 카페Park Avenue Cafe로 처음 출근한 날이었다. ‘파크 애비뉴 카페’에서는 1시간당 6.5달러의 저임금을 받을 거라는 셰프 제임스James의 얘기를 듣고서도 활기찬 주방의 모습에 오케이 했다. 결과적으로는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해서 일했고, ‘오버타임 율’이 적용된 임금을 받게 되어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었다.
내 사이즈보다 훨씬 큰 헐렁한 셰프 유니폼을 둘둘 말아 입고 예상 시간보다 30분 전부터 일과를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셰프를 좀 귀찮게 한 듯도 한데, 1시 30분 정도면 점심이 아직 끝난 시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는 완전 초보였던 내가 주방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눈치를 챌 리도 없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만 앞서 40분이나 일찍 출근해서 아직 점심 서비스 중인 셰프나 수셰프에게 얼른 할 일을 달라고 떼쓰는 격이었으니 말이다. 그 후로도 이 ‘눈치 없는 인턴’은 출근하는 내내 30분 일찍 출근했는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게 셰프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심어준 듯하다.
내가 처음 맡은 임무는 ‘찹샐러드Chop Salad’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약 1cm로 곱게 자르는 일이었다. 페타 치즈Feta Cheese, 셀러리, 양상추, 피망, 올리브, 오이, 질 좋은 엔초비등 11가지 재료가 들어간 샐러드를 발사믹 드레싱으로 버무려 내는 인기 애피타이저였다
‘가망제’ 스테이션은 손님이 처음으로 그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임무를 띠고 있다. 하지만 일하고 있는 요리사들은 대체로 초보자이거나 그 레스토랑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요리사가 잠깐씩 거치는 곳으로 잘못 인식이 된 듯하다. 모두 차가운 음식들이라서 ‘콜드 애피타이저 스테이션 불리기도 하는 음식들로 테린이나 여러 가지 샐러드 등을 만든다. 푸아그라 테린 레스토랑에서 직접 훈제한 연어 찹샐러드, 믹스그린샐러드, 참치타르타르 등을 기본으로 만들고 매일 새로운 ‘스페셜요리’가 한 두 가지씩 보태졌다. 다른 스테이션보다 메뉴의 가짓수가 많고 주문을 받는 즉시 무조건 빨리 음식을 내야 해서 보통 2~3명의 요리사가 함께 일한다.

처음 한 달간은 너무 힘들었다. 12시간 이상을 꼬박 서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에 적응하랴 처음 보는 메뉴에 적응하랴 또 레스토랑 주방이란 낯선 환경에 친숙해지는데 꼬박 한 달 정도 걸렸다 셰프도 무섭고 그때는 요리사들과 친해지지 않았을 때라 더욱 외롭고 힘들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느냐는 생각으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앞섰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부터 갑자기 출근하는 게 너무 즐거워졌다. 여전히 몸은 피곤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기분이고 열심히 일하는 게 통한 모양인지 셰프부터 밑에 요리사들까지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게 느껴지기도 했다. 아니 그보다는 이제 주방에 가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드디어 감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커다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바로 ‘핫애피타이저’ 스테이션으로 승진한 거였다. 그때까지 그 레스토랑에서 ‘엑스턴십’ 학생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셰프가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하는 걸 듣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나 혼자서 스테이션의 모든 일을 도맡아 책임져야 하는 일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재료 손질부터 서비스 시간에 주문 받은 음식을 주어진 시간에 맞춰 내느라 전보다 훨씬 긴장된 상태로 일했다. 요리사로서 겪을 수 있는 온갖 느낌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서비스를 끝마치고 나면 하도 땀을 흘려서 얼굴이 소금기로 거칠거칠해지고, 가끔 타월 없이 뜨거운 팬을 잡아 손바닥을 데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요리사들이 일하면서 ‘맥주’ 마시는 걸 왜 그렇게도 좋아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 덕분에 맥주를 좋아하게 된 셈이니 부모님이 아시면 ‘거 몹쓸 것을 배웠군’이라고 하실 테지만 너무 바빠서 물 마실 시간조차 없이 일하다가 잠깐의 짬에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잔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짜릿하다.
‘핫 애피타이저 스테이션’은 따뜻한 수프, 치즈를 채운 라비올리, 버섯을 넣은 카바텔리, Sweet Bread(송아지, 양고기 등의 흉선), 팬에 구워내는 푸아그라, 그릴에 구운 쿠엘을 곁들인 음식 등을 만드는 스테이션이었다. 주말에는 브런치 메뉴가 추가되었는데, 프렌치토스트와 시저 샐러드에 들어가는 ‘크랩 케이크’를 구워내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늦봄이 되면 제철을 맞는 ‘소프트 셸 크랩’을 몇 백 마리씩 구워낸 적도 있었다. 어떤 날은 오전은 ‘가망제’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핫 애피타이저’에서 일하느라 녹초가 된 적도 있었다.

무엇보다 ‘브런치’를 서빙하는 주말에는 아침 8시까지 출근해야 했는데 그게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토요일 저녁은 보통 빨라야 새벽 12시 30분이 퇴근인데, 그 시간에는 지하철도 뜸하게 다니니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새벽 2시가 다 되었다. 겨우 4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출근하는 기분이란 정말… 하지만 신기하게도 막상 주방 안에 들어서면 피곤함은 금세 사라지고 끝내야 하는 업무를 해결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엑스턴십 기간인 18주가 거의 끝나갈 무렵, 셰프가 학교로 돌아가지 말고 더 같이 일을 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너무 감사하지만,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그때 내겐 학교를 무사히 마치는 일이 더 큰 일이었다.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수업(와인 수업 등)이 나를 기다리는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 간절했다. 수업도 그렇지만, 학교로 돌아가기 전 6주간 혼자서 런던, 파리로 미술관 기행을 떠나는 일로 마음이 더욱 분주했다.
화를 잘 내던 셰프 덕에 울고 싶을 때도 참 많았었다. 그럴 때면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훔치고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씩씩하게 잘 버텨냈다. 엑스턴십 마지막 날까지 그랬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엑스턴십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가는 나를 축하하는 의미로 셰프가 ‘샴페인’을 한 병 따고 모든 요리사를 한자리로 불러 모았다. 그들과 작별인사를 나누던 도중 그 많은 동료 앞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의 갑작스러운 눈물에 분위기는 일순 싸해졌다. 머쓱해진 요리사들은 하나 둘 제자리로 돌아가 제일 바쁜 토요일 저녁 시간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 제공 : 그루비주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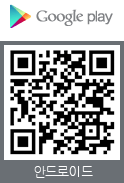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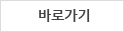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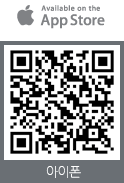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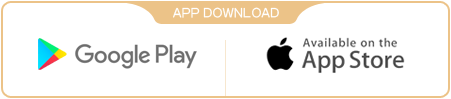









개별회신을 원하시면 여기에 문의하세요.